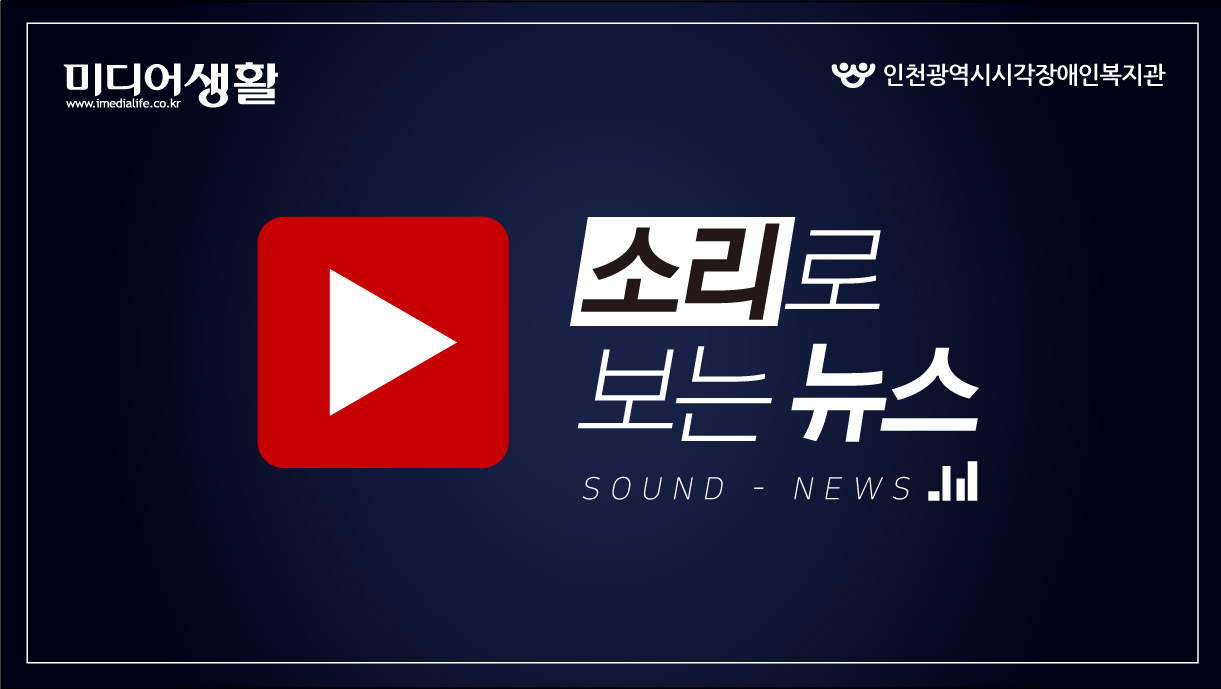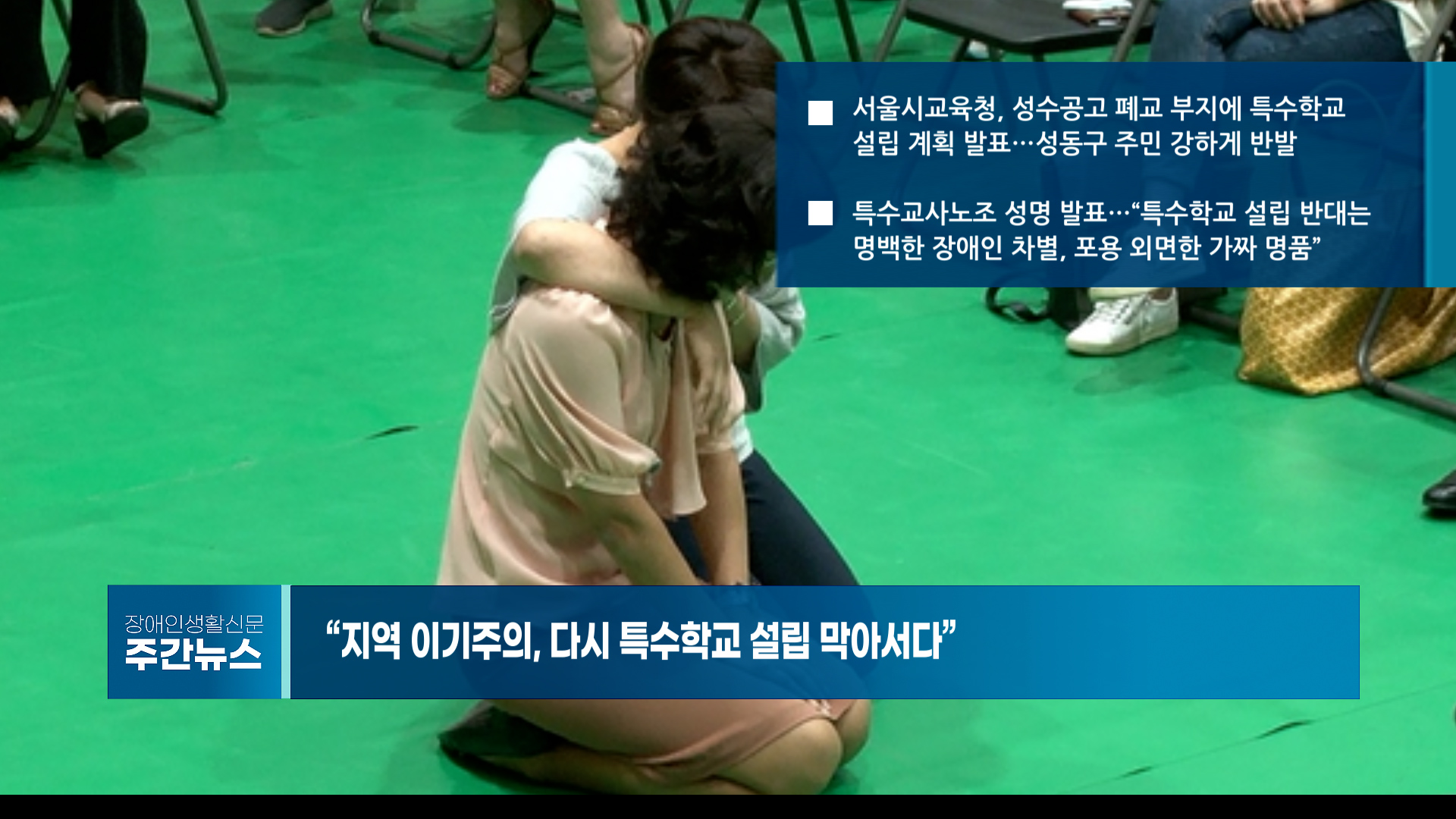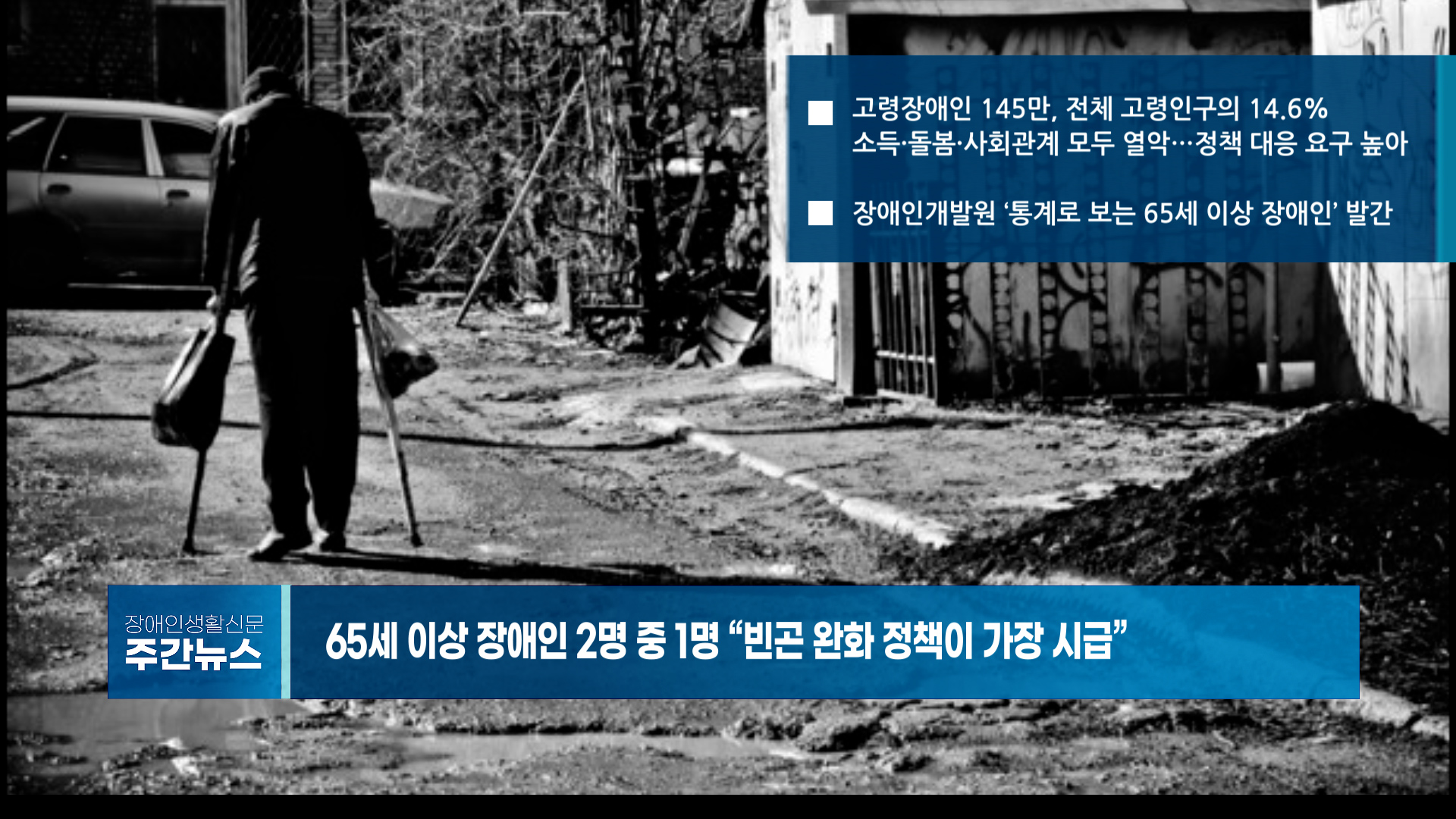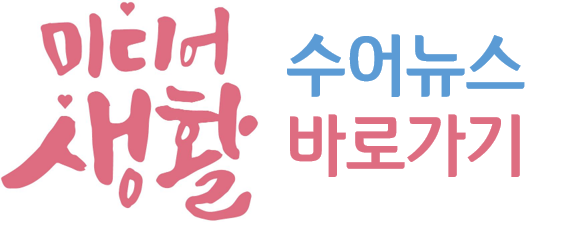장애인연금, “소득보전 대체 효과 미흡”
이 같은 사실은 한국장애인총연맹이 2월 18일 자로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2호를 통해 알려졌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주제로, 다양한 통계와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83만4000원의 63.3%에 불과하다.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011년 9만 원으로 시작한 기본급여는 올해 34만 원으로 올랐다.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해 장애인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13.3%에 머문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원을 감액했다.
특히, 장애당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가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 당사자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장애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일을 하면 주는 지원이 줄어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 다들 그냥 편한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하다. 특히 △ 부가급여의 현실화와 △수급 대상자 확대는 큰 틀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지난 10년간 겨우 1만 원 인상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2025년 기준 3~9만 원에 머물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부가급여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생계급여 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액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심한 장애는 79.9%, 경증 장애는 67.9%가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실제로 경증과 중증의 구분 없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현실이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여 유독 장애인 연금에만 2019년 이전의 장애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한 장애인이지만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행법 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를 기획 집필한 한국장총 윤다올 선임은 “장애인연금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금법 본연의 취지에 따라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보완 해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급 조건과 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 2025-03-07조회 :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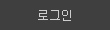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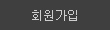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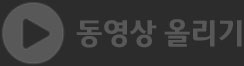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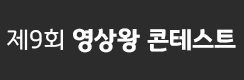





![[인천중구TV 뉴스]중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박람회](/Upload/uploadBoardThumn/건강박람회 섬네일 웹.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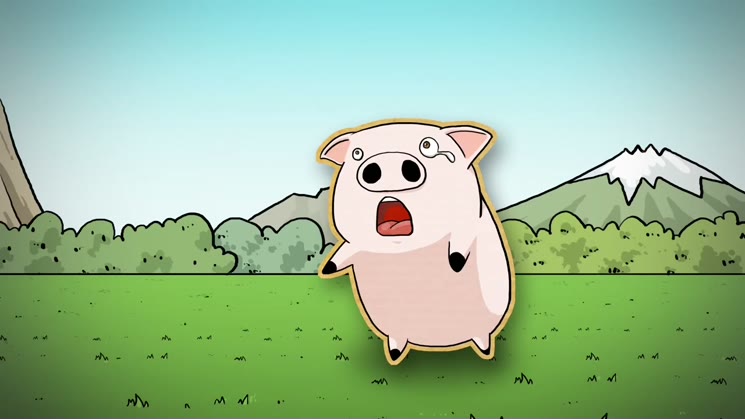
![[인천남구 도서관방송] 보이는 도서관 8회](http://media.incheonntv.com/MP_Media/MP_Media/sic1/thumbnail3/cb50b6d5-572a-4a6c-b67c-c950a4542792.wmv/5.jpg)